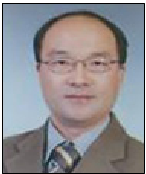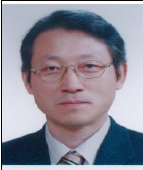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 10, No. 4, pp. 707-716, 2009
707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0권 제4호,
2009
708
일부 소방공무원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피로수준과 관련요인
709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0권 제4호, 2009
710
일부 소방공무원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피로수준과 관련요인
711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0권 제4호, 2009
712
일부 소방공무원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피로수준과 관련요인
71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0권 제4호, 2009
714
일부 소방공무원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피로수준과 관련요인
일부 소방공무원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피로수준과 관련요인
Ki-Bong Choi1, Kwang-Hwan Kim2, Young-Chae Cho3*
Abstract
The levels of psychosocial stresses and fatigue of firemen were analyzed to reveal the various factors related to them.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performed to 262 firemen in Cheongju City. In terms of various levels of psychosocial stresses, 12.2% were under potential stresses, 87.8% were under high-level of stress, but healthy group was not found. The levels of fatigue symptoms divided by the median of total scores was 51.1% of low levels, and 48.9% of high levels. Multiple stepwise analysis revealed that the factors of influence on psychosocial stresses with explanatory powers of 11.5% included subjective health status, job satisfaction, job demand and alcohol drinking habits. The factors of influence on fatigue symptoms with explanatory powers of 9.0% included subjective health and regular exercises. The study results indicate that the level of stress or fatigue is so complicatedly influenced by variable factors. Thus the effective strategy for stress and fatigue reduction among firemen should include additional programs focusing on health promotion. Key Words : Psychosocial Distress, Fatigue, Firemen
Psychosocial Distress and Fatigue Symptoms Among Firemen; and Its Related Factors
요 약 본 연구는 일부 소방직공무원들의 스트레스 및 피로 수준을 파악하고 , 스트레스와 피로에 관련된 요인을 구 명하고자 청주시의 소방공무원 262 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 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연구결과 전체 조사대상 소방공무원들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은 잠재적 스트 레스군이 12.2%, 고위험스트레스군이 87.8% 이었으며 , 건강군은 한 명도 없었다 . 피로수준은 중앙값을 기준으로 구분 하였을 경우 , 낮은 군이 51.1%, 높은 군이 48.9% 를 차지하였다 . 단계별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관적인 건강상태 , 직장생활만족도 , 직무요구도 , 음주상태 등이 선정되었으며 , 피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 , 규칙적인 운동여부 등이 선정되었다 . 이상의 연구결과는 소방공무원의 사회심리학적 스트레스나 피로수준이 대단히 높은 것을 시사하며 여러 요인들이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소방공무원들의 스트레스나 피로를 감소시키기기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1. 서론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화재 등의 각종 재해 현장 * 교신저자 : 조영채(choyc@cnu.ac.kr) 접수일 09년 02월 13일 수정일 09년 04월 16일
최기봉 1 , 김광환 2 , 조영채 3* 1 충청대학교 소방안전과, 2 건양대학교 병원관리학과, 3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및 의학연구소
에서 활동하므로 유독가스, 고온, 연기 등의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긴장과 휴식부족 등 비정상적인 직무환경에 서 비롯되는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다[1]. 또한 소 게재확정일 09년 04월 22일
방공무원은 다른 직종에 비해 직무와 관련된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유병율이 높은데, 이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상 특성이 24시간 비상대기 근무를 하며 귀중한 인명을 보호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등 고도의 스트레스와 가중된 피로가 원인이 될 수 있다[2]. 스트레스란 외부자극에 대한 신체 내부의 신경적, 내 분비적 및 면역적인 생리적 반응과 심리적 반응으로서 현대인의 정신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의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는 개인의 적응능력에 비추어 그 정도가 높거나 빈도가 잦고 기간이 길면 부적응 상태 가 되어 스트레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건강문제를 일으 키게 된다[3]. 소방공무원 역시 직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과중한 업무나 역할 갈등, 업무 자율성 결여 및 불규칙적 인 일상생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의해 신 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2]. 따라서 이들의 스 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관리 를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해 줄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과도한 정신적, 육체적 노동에 의해 야기되는 피 로상태는 인간의 기능 작용 저하나 손실을 초래하게 됨 으로서 일에 대한 의욕이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 니라 일상생활에의 부적응 등을 초래하게 된다[4,5]. 피로 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는 장시간 근무[6,7], 교대근무 및 과도한 직무요구[8], 과도한 스트레스의 경험이나 불규칙 한 수면습관[9], 흡연[10]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소방공무 원들 역시 이 같은 위험요인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스트레스나 피로는 높은 유병율과 질병 원인론에 서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파탄의 중요한 위험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요인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스트 레스와 피로 수준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부 소방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들 의 스트레스 및 피로 수준을 파악하고, 스트레스와 피로 에 관련된 요인을 구명함으로써 이들의 스트레스와 피로 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실시하였다. 2. 조사대상 및 방법 2.1 조사대상 및 기간 조사대상은 청주시의 소방직공무원 377명 전원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결과 285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고(회수율 75.6%), 이 중 응답이 부실하여 분석 에 사용할 수 없는 23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262명의 자 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2006년 6월 20일부터 2006년 7월 1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실시하였다. 2.2 조사방법 조사는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사전에 훈련 받은 조사원들이 조사대상 각 소방서를 방문하여 피조사 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 및 조사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얻은 다음, 설문지를 배포하고, 일과시간 외에 작 성토록 하여 회수하였다. 2.3 연구내용 및 조사변수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의 구성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 5문항, 직업관련 특성 8문항, 건강관련행위 6문항, 직무스트레스요인으로 업무요구도 5문항 및 업무 자율성 9문항, 직장의 사회적지지 8문항(상사의 지지 4문 항, 동료의 지지 4문항),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18문항, 피 로수준 1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변수의 구체적인 구 분 및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및 직업관련 특성 인구사회학적 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주관적인 건강상태 등을 측정하였으며, 연령은 「 29세 이하군 」 , 「 30-39세군 」 , 「 40-49세군 」 , 「 50세 이상군 」 으로 구분하였고, 결혼 상태는 「 미혼 」 과 「 기혼 」 으로 구분하였으며,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 건강하다 」 , 「 보 통이다 」 및 「 건강하지 못하다 」 로 구분하였다. 직업관 련 특성으로는 직급, 근속기간, 업무부서, 교대근무여부, 업무 중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입원여부,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적성 및 직업전환 의사 등을 조사하였다. 직급은 「 9급 이하 」 , 「 8급 」 , 「 7급 」 , 「 6급 이상 」 으로 구분 하였고, 근속기간은 「 4년 이하 」 , 「 5-9년 」 , 「 10-14 년 」 , 「 15-19년 」 , 「 20년 이상 」 으로, 업무부서는 「 소 방과 」 , 「 방호과 」 , 「 구조 . 구급과 」 , 「 기타 」 로 구분 하였으며, 교대근무여부는 「 한다 」 , 「 안 한다 」 로, 업무 로 인한 재해나 질병 등에 의한 입원여부는 「 있다 」 , 「 없다 」 로,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 만족한다 」 , 「 만족하지 못하다 」 로, 직업에 대한 적성여부는 「 적성 에 맞는다 」 , 「 적성에 맞지 않는다 」 로, 직업에 대한 전 환의사에 대해서는 전환의사가 「 있다 」 와 「 없다 」 로 구분하였다.
2) 건강관련행위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관련행위로는 흡연상태, 음주상 태, 커피음용여부, 규칙적 운동여부, 수면시간, 여가활동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흡연상태는 「 흡연군 」 , 「 비흡연 군 」 및 「 흡연중단군 」 으로 구분하였고, 음주상태는 「 음주군 」 과 「 비음주군 」 으로 구분하였으며, 커피음용 여부는 1일 커피음용횟수를 조사하였다. 규칙적 운동여 부는 1주일에 3회 이상, 회 당 30분 이상의 운동을 하는 사람을 「 운동군 」 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 비운동 군 」 으로 하였다. 3) 직무스트레스 요인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내용은 Karasek 등[11]의 직무내용설문지(Job Content Questionnaire; JCQ)를 우리 나라 근무환경에 맞게 번안하여 타당도가 검증된 설문지 를 사용하였다[12]. JCQ는 직장환경에 기인하는 직업성 스트레스의 요인으로서 업무의 요구도, 업무의 자율성 및 직장의 사회적 지지로 구성되어 있다. 업무의 요구도는 5 개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이며, 업무의 자율성은 의사결정 권한(decision authority) 3개 문항과 기량의 활용성(skill decision) 6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서 총 14개 항목에 대해 「 항상 그렇다 」 , 「 자주 그렇다 」 , 「 가끔 그렇 다 」 및 「 전혀 그렇지 않다 」 의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 였으며, 각각에 대해 0-1-2-3점을 부여하여 Karasek 등 [11]의 점수산정방식에 따라 업무요구도와 업무의 자율 성을 산정하였다. 즉, 업무의 요구도 점수가 높으면 업무 에 대한 심리적 부담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업무의 자 율성 점수가 높으면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이 높고 자신의 기량활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업 무의 요구도와 업무의 자율성에 대한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각각 0.672, 0.615이었다. 직장의 사회적 지지를 나타내는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지지는 각각 4항목의 척도로 되어 있으며, 「 매우 그렇 다 」 3점, 「 대부분 그렇다 」 2점, 「 조금 그렇다 」 1점 및 「 전혀 그렇지 않다 」 0점으로 응답하게 하여 합산한 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하였다. 8개 항목의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0.746이었다. 4)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Goldberg[13]의 일반건강측정 표(General Health Questionnaire; GHQ)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적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사회심리적 건 강측정도구(Psychosocial Well-bing Index; PWI)로 개발
된 18문항을 이용하였다[14]. PWI의 측정척도는 Likert의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서 「 항상 그렇다 」 0점, 「 자주 그렇다 」 1점, 「 가끔 그렇다 」 2 점, 「 전혀 그렇지 않다 」 3점의 점수를 부여한 후 이를 합산하여 PWI를 산정하였다. 이때 총점이 8점 이하인 군 을 건강군, 9점에서 26점까지를 잠재적 스트레스군, 27점 이상을 고위험 스트레스군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신뢰계수 Cronbach's α 값은 0.712이었다. 5) 피로수준 피로수준의 평가는 피로수준에 대한 자기평가와 표준 화된 피로측정도구에 의한 방법의 두 가지 방법으로 수 행하였다. 피로수준에 대한 자기평가방법으로는 최근 2 주 동안의 피로수준, 피로수준의 지속기간 및 피로의 원 인을 조사하였으며, 표준화된 피로측정도구에 의한 평가 는 Schwartz 등[9]에 의해 개발된 29개 항목의 피로측정 도구를 재구성하여 제작한 19개 항목의 다차원피로척도 (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 MFS)를 이용하였다. MFS의 내용은 전반적 피로도 8개 항목, 일상생활기능장 에 6개 항목, 상황적 피로 5개 항목의 세 개 하부영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해 1점부터 7점까지 7 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피로수준의 평가는 이 들 점수를 합산하여 득점이 높을수록 피로수준이 높은 것으로 하였다. 19항목의 MFS에 대한 신뢰도 검정결과 Cronbach's α 값은 0.848이었다. 2.4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자료는 전산입력 후 SPSSWIN(ver 11.0)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심리적 스트 레스 수준 및 피로수준과 관련된 제 변수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독립변수에 따 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및 피로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t-test 및 ANOVA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시 직 무스트레스요인으로 업무요구도, 업무자율성 및 사회적 지지는 중앙값(median)을 기준으로 양분하여 사회 심리 적 스트레스 수준과 피로 수준을 비교하였다. 또한 각 독 립변수들의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및 피로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 수준은 p<0.05로 하였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피로수준의 평균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변수 인수 평균±표준편차 p-value* 성별 0.616 남자 242 33.07±9.42 여자 20 34.15±4.67 연령(년) 0.899 ≤29 48 32.60±4.57 30-39 116 33.20±5.36 40-49 82 33.62±14.43 50≤ 16 32.12±6.29 교육수준 0.226 ≤고등학교 109 32.34±5.84 대학≤ 153 33.73±10.88 결혼상태 0.694 기혼 209 33.27±9.94 미혼 53 32.71±4.93 주관적 건강상태 0.000 건강 82 30.84±5.06 보통 156 33.44±5.38 비건강 24 39.25±24.59 계 262 33.16±9.14 * : t-test or one-way ANOVA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스트레스 및 피로수준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스트레스 및 피로수준은 표 1과 같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의 평균점수를 성별로 보 면, 남자가 33.07±9.42점, 여자가 34.15±4.67점으로 여자 가 남자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40대까지는 약간 증가하다가 50대 이상에서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교육정도 별로는 대학 이상 학력군이 고등학교 이하 학력군보다 높았으나 역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혼상태별로는 기 혼군이 미혼군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주관 적인 건강상태별로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할수록 스 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0). 피로수준의 평 균점수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91.85±31.09점, 여자가 103.85±16.59점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040). 연령별로는 40대에서 가장 낮고 50대 이상에 서 가장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교육정도별로는 고등학교 이하 학력군이 대학 이상 학력군보다 높았으나 역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혼상태별로는 미혼군이 기
피로 평균±표준편차 p-value* 0.040 91.85±31.09 103.85±16.59 0.102 93.54±18.64 93.87±18.06 87.84±21.73 107.68±97.68 0.935 92.95±42.20 92.64±17.87 0.856 92.09±19.26 92.94±32.64 0.000 81.70±19.63 96.43±34.65 106.75±17.11 92.77±30.38 혼군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주관적인 건강 상태별로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할수록 피로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0). 3.2 직업관련 특성별 스트레스 및 피로수준 직업관련 특성별 스트레스 및 피로수준은 표 2와 같 다. 직급별 사회심리학적 스트레스 수준은 7급에서 가장 높고 6급 이하에서 가장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근무경력별로는 뚜렷한 경향이 없었다. 근무부서별로는 소방업무부서가 가장 높고 다음이 구급 . 구조업무부서, 방호업무부서의 순이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교대 근무여부별로는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군이 하는 군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업무상 질병이나 재해 등에 의한 입원경험여부별로는 입원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직장생활 만족도별로는 불만족하다는 군이 만족하다는 군보다 스 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p=0.044). 직업에 대한 적성별로는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군이 맞는다는 군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전직에 대한 생각별로는 전직할 생각이 있다는 군이 없다는 군보다 높았으나 역
[표 2] 직업관련 특성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피로수준의 평균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변수 인수 평균±표준편차 p-value* 직위(급) 0.268 ≤9 67 32.94±4.65 8 115 32.91±5.42 7 54 35.03±17.32 6≤ 26 30.92±5.69 근무경력(년) 0.815 ≤4 78 33.20±4.70 5-9 32 32.81±5.20 10-14 99 33.75±13.34 15-20 36 32.80±5.48 20≤ 17 30.88±6.40 근무부서 0.968 소방업무 59 33.61±16.35 방호업무 91 32.98±5.72 구급.구조업무 90 33.17±5.45 기타 22 32.59±5.73 교대근무 0.872 하고 있음 191 33.10±10.37 하지 않음 71 33.30±4.40 업무상 입원경험유무 0.538 있음 29 32.17±5.31 없음 233 33.28±9.51 직장생활 만족도 0.044 만족 197 32.50±5.21 불만족 65 35.13±15.89 직업에 대한 적성 0.529 맞음 218 33.00±9.81 맞지 않음 44 33.95±4.58 전직에 대한 생각여부 0.520 전직생각 있음 84 33.69±5.05 전직생각 없음 178 32.91±10.54 계 262 33.16±9.14 * : t-test or one-way ANOVA 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직급별 피로수준은 6급 이상에 서 가장 높고 7급에서 가장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 고, 근무경력별로는 경력이 10-19년인 경우보다 9년 이하 나 20년 이상인 경우에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근무부서별로는 구급 . 구조업무부서에서 가장 높았고 다 음이 방호업무부서, 소방업무부서의 순이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교대근무여부별로는 교대근무를 하는 군 이 하지 않는 군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업 무상 질병이나 재해 등에 의한 입원경험여부별로는 입원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직장생활 만족도별로는 불만족하다는 군이 만족하다는 군보다 피로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p=0.036). 직업에 대한 적성별로는 적성에 맞지 않다는 군이 맞는다는 군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피로 평균±표준편차 p-value* 0.832 92.11±19.32 93.83±18.78 89.92±19.98 95.65±78.50 0.738 92.96±18.08 95.50±18.24 90.90±20.35 91.13±18.71 101.05±97.05 0.629 88.25±17.26 93.48±20.02 94.54±44.32 94.61±22.98 0.721 92.36±30.98 88.06±24.94 0.378 88.06±24.94 93.35±30.98 0.036 90.51±32.61 99.61±21.05 0.633 92.36±32.23 94.97±18.83 0.007 100.05±44.60 89.33±19.77 92.77±30.38 전직에 대한 생각별로는 전직할 생각이 있다는 군이 없 다는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7). 3.3 건강관련행위별 스트레스 및 피로수준 건강관련행위별 스트레스 및 피로수준은 표 3과 같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의 경우, 흡연상태별로는 현재 흡연자가 비흡연자나 흡연중단자보다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음주상태별로는 비음주군이 음주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48). 운동여부별로는 규칙적인 운 동을 하지 않는 군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군보다 높았 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수면시간별로는 수면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군이 충분하다는 군보다 스트레스 수 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46), 커피음용여부별로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군이 마시는 군보다 높았으나 유의
[표 3] 건강관련행위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피로수준의 평균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변수 인수 평균±표준편차 p-value* 흡연상태 0.886 현재흡연 115 32.91±5.06 비흡연 101 33.19±13.29 흡연중단 46 33.69±5.16 음주상태 0.048 음주 213 32.62±5.41 비음주 49 35.48±17.84 규칙적 운동여부 0.856 한다 178 32.08±10.52 안한다 84 33.30±5.16 수면시간 0.046 충분함 96 31.8±85.70 충분하지 못함 166 33.89±10.58 커피음용(컵/일) 0.564 0 32 34.75±22.25 1-2 85 33.12±5.82 3≤ 145 32.834.94 여가활동여부 0.041 한다 135 32.13±5.13 안한다 127 34.25±11.95 계 262 33.16±9.14 * : t-test or one-way ANOVA 한 차이는 없었다. 여가활동여부별로는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군이 한다는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41). 피 로수준의 경우, 흡연상태별로는 현재 흡연자가 비흡연자 나 흡연중단자보다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음주 상태별로는 음주군이 비음주군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운동여부별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군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p=0.004), 수면시간별로는 수면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 는 군이 충분하다는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7). 커피음용여부별로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군이 마시는 군 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여가활동여부별로 는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군이 한다는 군보다 높았으나 역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4 직무스트레스 요인별 스트레스 및 피로수준 직무스트레스 요인별 스트레스 및 피로수준은 표 4와 같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의 경우, 업무요구도별로 는 업무요구도가 높은 군이 낮은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 고(p=0.045), 업무자율성별로는 업무자율성이 높은 군이 낮은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38). 직장 내 상사의 지지도별로는 상사의 지지도가 낮은 군이 높은 군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동료의 지지도별로는 동
피로 평균±표준편차 p-value* 0.142 89.41±18.92 97.40±42.64 90.97±18.01 0.756 93.05±32.18 91.55±21.02 0.004 99.05±19.33 100.64±44.87 0.007 86.15±19.04 96.59±34.80 0.422 95.46±21.78 95.54±45.29 90.55±19.06 0.476 91.34±38.12 94.28±19.02 92.77±30.38 료의 지지도가 낮은 군이 높은 군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p=0.021). 그러나 피로수준의 경우, 업 무요구도, 업무자율성, 직장 내 상사의 지지도 및 동료의 지지도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5 스트레스 수준과 피로수준의 관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피로수준의 점수를 보면 표 5와 같다. 전체적으로 건강군은 한명도 없었고, 다음은 잠재적 스트레스 군 83.78±25.32점, 고위험 스트 레스군 94.02±30.86점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군일수 록 피로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44). 성별로도 남여 모두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군일수록 피로점수가 높았으며 남자에서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48). 3.6 스트레스와 피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대상자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피로수준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관련 특성, 건강관련행위 및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변 수를 독립변수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피로수준을 종 속변수로 하여 단계별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4] 직무스트레스요인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피로수준의 평균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변수 인수 평균±표준편차 p-value* 업무요구도 0.045 낮은 군 † 152 32.23±8.32 높은 군 ‡ 110 34.43±4.45 업무자율성 0.038 낮은 군 † 155 32.18±9.26 높은 군 ‡ 107 34.57±4.26 상사의 지지도 0.308 낮은 군 † 152 33.65±4.97 높은 군 ‡ 110 32.48±9.85 동료의 지지도t 0.021 낮은 군 † 203 33.86±9.87 높은 군 ‡ 59 30.74±5.38 계 33.16±9.14 * : t-test †, ‡ : Each total score was divided by the median and categorized into low and high. [표 5]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별 피로수준의 평균점수 남자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평균±표준편차 건강군(≤8) 0.00±0.00 잠재적 스트레스군(9-26) 82.96±25.31 고위험스트레스군(27≤) 93.16±31.69 p-value* 0.048 계 91.85±31.09 * : one-way ANOVA [표 6]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피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독립변수 B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상태 2.635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1.840 직무요구도 0.535 음주상태 2.794 (상수) 17.109 피로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12.360 규칙적 운동여부 9.508 (상수) 58.230 으로는 주관적인 건강상태, 직장생활만족도, 직무요구도, 음주상태 등이 선정되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1.5%이 었다. 피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관적 건강
피로 평균±표준편차 p-value* 0.968 92.83±36.37 92.68±19.42 0.858 92.49±36.84 93.17±17.32 0.364 94.22±18.53 90.76±41.56 0.928 92.67±18.21 93.08±54.76 92.77±30.38 여자 계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0.00±0.00 0.00±0.00 103.48±16.12 83.78±25.32 109.57±16.59 94.02±30.86 0.760 0.044 103.85±16.59 92.77±30.38 SE Beta t p-value R 2 0.543 0.172 2.793 0.006 0.056 0.731 0.157 2.516 0.012 0.083 0.250 0.128 2.138 0.033 0.100 1.379 0.119 2.026 0.044 0.115 2.982 5.738 0.000 3.041 0.243 4.064 0.000 0.069 3.886 0.146 2.447 0.015 0.090 7.178 8.113 0.000 상태, 규칙적인 운동여부 등이 선정되었으며 이들의 설명 력은 9.0%이었다.
4. 결론 및 토의 소방공무원은 24시간 비상대기를 하다가 119 신고접 수 후 즉시 출동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 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근무시간 내내 긴장상태에 놓여 있게 되며 재해현장에서는 각종 위험과 사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피로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소방공무원들의 스트레스와 피로 수준을 파악해 보고 스트레스 및 피로에 관여하는 제 요 인을 밝혀 봄으로서 보다 더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조사대상 소방공무원들의 스트레스 수준의 규모 를 파악한 결과 잠재적 스트레스군이 12.2%, 고위험스트 레스군이 87.8%이었으며, 건강군은 한 명도 없었다. 따라 서 조사대상자 중 거의 90%가량이 심각한 수준의 스트 레스를 받으면서 소방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트레스 수준은 국내의 선행 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직장인들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대 단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세진 등[15]은 우리 나라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연구에서 건강군 5%, 잠재적 스트레스군 73%, 고위험스트레스군 22%로 보고하고 있 는데 본 연구 결과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 며, 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미국의 예일대학의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약 29% 가량이 직장에서 심각 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고[16], 캐나다 퀘백주의 사 무직 남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7.8%가 스 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보고[17]하고 있어 스트레스 수준 이 본 연구와 뚜렷하게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와 같이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조사대상자가 24시간 비상대기를 하면서 화재나 재해발 생시 긴급 출동하는 소방서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 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이들은 심리적으 로 많은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 각된다. 조사대상 소방공무원들의 스트레스에 관여하는 제 요 인들을 파악해 보면,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할수록, 직장생활에 불만족하다는 군, 비음주군, 수면시 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군,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군, 업 무요구도가 높은 군, 및 동료의 지지도가 낮은 군에서 그 렇지 않는 군보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 타났다. 이 같은 결과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도 직위가 낮 거나 직장생활에 만족하지 못한 군에서 스트레스가 높다 고 보고[18]하고 있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군은 하는 군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15,19], 흡연에 있어서도 습관적 흡연과 커피음용이 만성적인 스
트레스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20]. 또 한 업무요구도가 높을 때, 업무 자율성이 낮을 때, 직장 내 상사나 동료의 지지도가 낮을 때 스트레스 수준이 유 의하게 높으며, 특히 직무요구도와 직무 자율성 같은 직 무내용은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요인을 증가시킨다는 여러 보고가 있다[21]. 한편 직장 내에서의 동료나 상사로부터 제공받는 적절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2]. 국내의 연구에서 도 직무부담이 많고 직무자율성이 적으며 주변의 직장동 료나 상사로부터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 람은 직무부담이 적고 직무자율성이 높으며 동료나 상사 로부터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받는 사람에 비해 고위험 스트레스 군이 될 위험이 높아 시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의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23].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직업관련 특성보 다 건강관련행위나 직무내용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미나 등[24]도 스트레 스는 인구사회학적특성이나 작업관련변수보다도 건강관 련행위의 실천여부, 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 직장 내에 서의 사회적 지지와 같은 직무내용, 인성이나 자기존중심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 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한편, 다차원피로척도(MFS)를 이용하여 피로수준을 평가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피로수준은 여자에서, 주관 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할수록, 직장생활에 불만족 하다는 군, 전직할 생각이 있다는 군, 규칙적인 운동을 하 지 않는 군, 수면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군에서 그렇 지 않는 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서 여자 가 남자보다 피로수준이 높은 것은 기존의 여러 연구에 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4], 직무내용별로는 직무의 자율성이 낮을수록, 직무 요구도가 높을수록, 동 료의 지지도가 낮을수록, 피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25]되고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피로수준을 보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군일수록 피로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도 남여 모두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군일수록 피로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관 련성은 김석환 등[26]의 연구에서도 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강진욱 등[19]도 피 로와 스트레스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한 편, Bultmann 등[27]은 피로와 스트레스는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지만 이들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다르 며, 또한 개념적, 기능적, 요인적으로도 다르다고 하여 스 트레스와 피로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은 있으나 그 원인 들은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업무요구도 및 업무의 자 율성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동료의 지지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피로수준의 점수는 상사의 지지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업무요구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은 증가하는 반면, 업무 자율성이 떨어지고, 직장 내 동료나 상사의 사회적 지지도가 낮을 수록 스트레스 수준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피로 수준 역시 강진욱 등[19]의 연구에서도 직무자율성, 상사 의 지지, 동료의 지지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 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같은 경향임을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첫 째,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 스트레스 및 피로와 위험요인 이 한 시점에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들과의 관련성은 파악할 수 있었 으나 인과관계는 규명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일개 시의 일부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소 방공무원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 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피로 수준, 직무내용 특성 등의 측정은 응답자의 주관적인 자 기기입식방법에 의존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응답편의 (response bias)가 개재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 러나 그동안 국내에서는 스트레스나 피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시행되었으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 구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및 피로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 고 본다. 결론적으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피로는 일의 수행 과정상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필연적인 것임을 인 식할 때 이에 대한 회피나 모면보다는 예방적 활동, 전략 의 모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스트레스나 피로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와 개인 및 직 장 단위의 스트레스 및 피로의 감소방안에 대한 프로그 램의 개발 및 실천 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이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1]
- 강경화, 이강숙, 김석일, 맹광호, 홍현숙, 정춘화. " 일부 소방공무원의 음주와 직무스트레스와의 관련 성." 대한산업의학회지, 13권4호, pp.401-412, 2001.
- [2] 이병길, 이연주, 정병권, 손세일, 이종일, 김성광. "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질환과 건강관리방안." 인 천 남동공단 소방서, 2000.
- [3] Fehring RJ. "Effect of Biofeedback-aided relaxation
- on the psychological stress symptoms of college student." Nursing Research, Vol 32(6), pp.362-366, 1983.
- [4] Chen M. "The epidemiology of self-perceived fatigue among adults." Prev Med, Vol 15, pp.74-81, 1986.
- [5] David A, Pelosi A, MacDonald E, Stephens D, Sedger D, Rathbone R, Mann A. "Tired, weak or in need of rest; a profile of fatigue among general practice." BMJ, Vol 301, pp.1199-1202, 1990.
- [6] Harma M. "Are long workhours a health risk?" Scand J Work Environ Health, Vol 29(3), pp.167-169, 2003.
- [7] van der Hulst M, "Long workhours and Health." Scand J Work Environ Health, Vol 29(3), pp.171-188, 2003.
- [8] 손미아, 성주헌, 염명걸, 공정옥, 이혜은, 김인아, 김정연. "한 자동차공장의 1주 연속 12시간주야맞 교대근무 노동자들의 심박동수 변이." 예방의학회 지, Vol 37(2), pp.182-189, 2004.
- [9] Schwartz JE, Jandorf L, Krupp LB. "The measurement of fatigue: a new instrument" J Psychosom Res, Vol 37(7), pp.753-762, 1993.
- [10] Akerstedt T, Knutsson A, Westerholm P, Theorell T, Alfredsson L, Kecklund G. "Sleep disturbances, work stress and work hours a cross-sectional study." J Psychosom Res, Vol 53, pp.741-748, 2002.
- [11] Karasek R, Theorell T, Schwartz JE, Schnall PL, Pieper CF, Michela JL. "Job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the prevalence of myocardial infarction in the US Health Examination Survey (HES) and the Health and Nutrition Survey(HANES)." Am J Public Health, Vol 78, pp.910-918, 1988.
- [12] 장세진.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수준의 파악. 스트레스 감소프로그램의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2001.
- [13] Goldberg DP. "Manual of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Windsor, England: NFER publishy, pp. 108-122, 1978.
- [14] 장세진. "건강통계자료 수집 및 측정의 표준화-. 스트레스." 대한예방의학회편, 계축문화사, pp.92-143, 2000.
- [15] 장세진, 고상백, 강명근, 차봉석, 박종구, 현숙정, 박준호, 김성아, 강동묵, 장성실, 이경재, 하은희,
- 하미나, 우종민, 조정진, 김형수, 박정선. "우리나 라 직장인 스트레스의 역학적 특성." 예방의학회 지, 38권1호, pp.25-37, 2005.
- [16] NIOSH Working Group. "Stress at work." NIOSH, pp.12-23, 1999.
- [17] Bourbonnais R, Brisson C, Moisan J, Vezina M, "Job strain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white-collar workers." Scand J Work Environ Health, Vol 22, pp.239-245, 1996.
- [18] Kivimaki M, Vahtera J, Pentti J, Ferrie JE. "Factors underlying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downsizing on health of employees: longitudinal cohort study." BMJ, Vol 320(7240), pp.971-975, 2000.
- [19] 강진욱, 홍영습, 이현재, 예병진, 김정일, 김정만, 정갑열, 김준연. "제조업 남성 근로자의 피로 및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산업의학회 지, 17권2호, pp.129-137, 2005.
- [20] Conway TL, Ward HW, Vickers RR, Rahe RH. "Occupational stress and variation in cigarette, coffee, and alcohol consumption." J Health Soc Behav, Vol 22, pp.155-165, 1981.
- [21] Chang SJ, Koh SB, Cha BS, Park JK, "Job characteristics and blood coagulation factors in Korean male workers." J Occup Environ Med, Vol 44, pp.997-1002, 2002.
- [22] Schoenbach VJ, Kaplan BH, Fredman L, Kleinbaum DG. "Social ties and mortality in Evans county, Georgia." Am J Epidemiol, Vol 123, pp.577-591, 1986.
- [23] 장세진, 차봉석, 고상백, 강명근, 고상열, 박종구. "직업적 특성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간의 관련 성." 예방의학회지, 30권, pp.129-143, 1997.
- [24] 하미나. "한국인 직무스트레스와 건강영향에 관 한 기획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 구원, 2001.
- [25] Kant IJ, Beurskens A, Schroer C, Nijhuis F, van Schayck C, Swaen G. "An epidemiological approach to study fatigue in the working population: results from the Maastricht Cohort Study of Fatigue at Work." J Occup Environ Med, Vol 60(9), pp.32-39, 2003.
- [26] 김석환, 윤계수. "연구직 근로자의 스트레스와 피 로에 관한 조사." 대한산업의학회지, 10권1호, pp.105-115, 1998.
[27] Bultmann U, Kant • 1983년 J, Kasl 2월 SV, : 충북대학교 Beurskens AJ, 대학원 Van den Brandt PA. (공학석사) "Fatigue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the • working 1990년 population 8월 : 충북대학교 psychometrics, 대학원 prevalence, and correlates." (공학박사) J Psychosom Res, Vol 52, pp.445-452, • 2002. 1982년 6월 ~ 현재 : 충청대학 최 기 봉 (Ki-Bong Choi) 교 소방안전과 교수 [정회원]
• 1983년 2월 : 충북대학교 대학원 (공학석사) • 1990년 8월 : 충북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 1982년 6월 ~ 현재 : 충청대학 교 소방안전과 교수<관심분야> 소방안전, 산업보건, 건강관리김 광 환 (Kwang-Hwan Kim)
김 광 환 (Kwang-Hwan • 2001년 Kim) 2월 : 계명대학교 [정회원] 대학원 (보건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 교병원 의무기록실장 • 2006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 교 병원관리과 조교수
• 2001년 2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보건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 교병원 의무기록실장 • 2006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 교 병원관리과 조교수<관심분야> 의무기록정보, 보건관리, 병원관리[정회원]
조 영 채 (Young-Chae • 1980년 Cho) 2월 : 서울대학교 [정회원] 보건대 학원 (보건학석사) • 1991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수의학박사) • 1982년 6월 ~ 현재 : 충남대학 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 1980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 학원 (보건학석사) • 1991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수의학박사) • 1982년 6월 ~ 현재 : 충남대학 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관심분야> 환경 및 산업보건, 건강관리